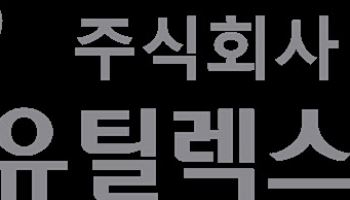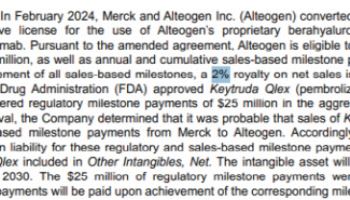팜이데일리 프리미엄 기사를 무단 전재·유포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이에 대해 팜이데일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합니다.
[이데일리 김명선 기자]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급성장세를 거듭하는 제약·바이오 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등에 이어 한국의 차세대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데일리의 제약·바이오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 ‘팜이데일리’에서는 한국을 이끌어 갈 K-제약·바이오 대표주자들을 만나봤다. 엑소좀 시장 선두주자를 노리는 ‘엠디뮨’이 이번 주인공이다. ‘엑소좀’의 성장세가 무섭다. 엑소좀은 세포가 세포 외부로 방출하는 세포외소포체(EV) 중 하나다. 엑소좀은 그중에서도 작은 20~100nm(나노미터) 크기 소포체다. 세포 간 신호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차세대 약물 전달체로 주목받고 있다. 생체 유래 물질이라 부작용도 적어 엑소좀을 활용한 치료제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글로벌 엑소좀 시장은 2030년께 22억8000만달러(약 2조911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 (사진=엠디뮨 홈페이지) |
|
아직 세계적으로 엑소좀을 활용해 상용화한 치료제는 없다. 상업화 단계까지 가는 데 기술적인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김지운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연구완과 유승준 메디픽 대표는 4월 발간한 ‘차세대 치료제 엑소좀의 연구개발 동향’을 통해, “순도가 높은 엑소좀을 분리해내는 게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작업의 복잡성 탓에 생산 수율이 낮다. 타겟 물질을 탑재한 엑소좀을 생산해 제품화까지 진행하기도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엑소좀의 양이 적어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엠디뮨은 이러한 엑소좀의 단점을 극복한 원천기술로 승부를 보는 전략을 펼친다. 2015년 창업 당시 포항공대에서 이전받은 ‘세포유래베지클 대량 제조 특허 기술’이다. 인체 세포를 압출해 세포외소포체의 일종인 세포유래베지클(Cell-Derived Vesicle, CDV)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이다. CDV는 엑소좀과 체내에서 똑같은 정보전달체 역할을 할 수 있다.
카이스트 생물공학과를 졸업한 후 한미열린기술투자 심사역, 벤처기업 케미존 공동창업자, 카이노스메드 부사장 등을 지낸 배신규 엠디뮨 대표는 “우연한 기회에 세포유래베지클 기술을 접하게 됐다.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이셨다. 이 기술로 어머니의 항암 치료를 돕고 싶다는, 어쩌면 무모한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기술투자 심사 경험에 비춰볼 때, 개발만 잘하면 차별화된 기술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 | 배신규 엠디뮨 대표. (사진=엠디뮨 제공) |
|
엠디뮨의 핵심 기술인 세포유래베지클 대량 제조 특허 기술은, 세포를 직접 압출해 엑소좀과 특징과 모양이 비슷한 나노입자들을 대량으로 만들어낸다. 자연 분비되는 엑소좀의 양보다 세포유래베지클을 10배에서 수십 배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게 배 대표 설명이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유럽·중국·일본에 특허 등록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배 대표는 “세포에서 분비되는 엑소좀은 품질이 균일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치료제로 개발하려면 엑소좀을 균일하게 분리·정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세포를 압출해 틀을 통과하도록 한다. 그러면 엑소좀과 크기나 모양, 특징이 비슷한 세포유래베지클이 균일하게 많이 생산돼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세포유래베지클이나 엑소좀 등 세포외소포체는 그 자체로 신약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약물을 탑재한 전달체로 쓰일 수도 있다. 현재 엠디뮨은 신약보다는 전달체로 활용하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그는 “5~6년 전만 해도 세포외소포체를 신약으로 만들려는 기업이 80%, 약물 전달체로 활용하려는 기업이 20%였다. 그러나 약이 효능을 보이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어, 이 비율이 최근엔 역전됐다. 우리도 약물전달체 기능에 좀 더 집중한다”고 강조했다.








!['2% 로열티'가 무너뜨린 신뢰…알테오젠發 바이오株 동반 하락[바이오맥짚기]](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1/PS26012201091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