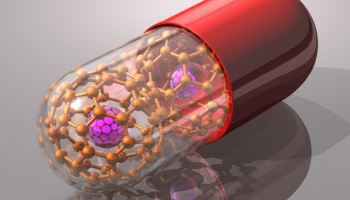[이데일리 왕해나 기자] “미국에서는 바이오 벤처를 창업할 때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자들이 나서 경영을 책임지고, 창업자들은 연구개발을 충실히 해서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구조가 성숙되지 않았다.”
이준행(사진)
박셀바이오(323990) 대표는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바이오 벤처를 상장까지 가이딩 해주고 경영 컨설팅 해줄 만큼의 조직이 없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멋 모르고 시작했다.” 그는 2010년 박셀바이오 설립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전남대 의과대학 임상 백신 연구개발사업단에서 설립된 박셀바이오는 항암 면역치료제 기업이다. 자연살해세포(NK)와 수지상세포(DC)를 활용해 항암 면역치료 플랫폼을 개발한다. 현재는 코스닥 시가총액 1조2000억원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는 “실험실 연구 결과가 좋아서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처음에는 기술이전을 하려고 생각했지만 받아줄 제약사가 마땅치 않고 기술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직접 창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셀바이오는 간암치료제뿐만 아니라 다발골수종 치료제, 췌장암·난소암 치료제, 반려동물 전용 암 치료제 등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췄다. 이 중 간암치료제는 임상 2a상을 진행 중으로, 첫 번째 환자에서는 완전 관해(증상이 없어진 상태) 반응을 확인하며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이 대표는 실험실 연구와 사업화 과정의 다른 점에 대해 “논문에서는 가능성을 보인 것만으로 발표하고 박수받고 끝나는데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있어야 하고 특허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창업에 우호적지 않은 학내 분위기, 창업주가 경영까지 도맡아야 하는 사업 구조는 학내 바이오 벤처의 활성화를 제한하는 요소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 교원 창업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대학들이 있다”면서 “창업도 교원 성과에 반영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여전히 발표 논문 수, 지원 연구비 규모 등으로 교원을 평가하는 곳도 있어 창업한 교수들은 운신의 폭이 좁은 경우를 종종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업계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교수 창업 모델은 창업자 주도 모델과 VC 주도 모델의 두 가지가 있는데, 한국은 전자만 있는 반면 미국은 후자가 잘 발달돼있다. 연구개발에 집중하던 교수들은 투자유치와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나타나곤 한다. 이 대표는 “투자를 유치뿐만 아니라 회사를 제대로 꾸려나가는데 있어 다양한 방법이 있었으면 한다”면서 “우리나라에는 VC가 학교 기술을 끌고와서 직접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등의 사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산학협력단이나 기술지주회사는 아직 경험치가 작다는 평가다. 그는 “기술지주도 있고 산학협력단도 있지만 전문성이 VC만 하지 못하다”면서 “기술지주도 이익을 남겨야 하기에 대학에서 만든 기술이 성공할 때까지 장기 투자하는 것이 쉽지 않고, 임상시험에 드는 대규모 자금을 대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미국의 VC 투자 규모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준”이라며 “학내 창업을 기업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전문화된 인력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바이오 벤처 창업 분위기에 대해서는 ‘사람이 없다’는 우려다. 이 대표는 “수도권은 제외한 지역에서는 바이오 연구개발에 뛰어드는 국내 인력들이 없어 해외 인력들을 끌어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바이오 연구에도 얼마든지 길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기회도 있는 만큼 뜻이 있는 젊은이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