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한 주(1월22일~1월28일)의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 이슈를 모았다. 이번 주에는 치매 조기 진단과 관련된 소식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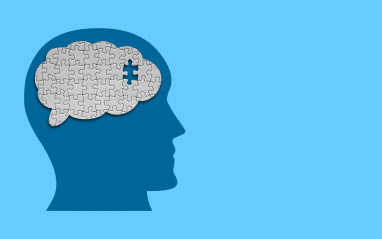 | | (사진=게티이미지) |
|
뇌의 회색질 두께로 조기에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메디컬 익스프레스는 텍사스 대학 의대 알츠하이머병·신경퇴행 질환 연구소의 신경과 전문의 클라우디아 사티자발 교수 연구팀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프레이밍햄 심장 연구(FHS) 참가자 1000명(70~74세)의 MRI 뇌 영상을 분석한 결과다. 연구팀은 10년 전에 찍은 뇌 MRI 영상으로 치매가 발생한 사람과 치매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연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의 회색질 외피 두께가 두꺼울수록 치매와 연관이 없고 얇을수록 치매와 연관이 있다. 대뇌는 신경세포로 구성된 겉 부분인 회색질과 신경세포들을 서로 연결하는 신경 섬유망이 깔린 속 부분인 백질 이뤄져 있다.
회색질 외피 두께 수치가 최하위 25%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머지 75%에 해당하는 사람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3배 이상 높았다. 회색질 두께가 두꺼울수록 전체적인 인지, 일화 기억 기능이 좋았다.
다만 연구팀은 회색질의 두께가 치매 위험을 높이는 ApoE4 변이 유전자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봤지만, 전혀 관계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알츠하이머병 협회 학술지 ‘알츠하이머병과 치매’(Alzheimer‘s & Dementia) 최신호에 실렸다.
혈액 검사로 알츠하이머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공개됐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스웨덴 예테보리대 연구팀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연구팀은 임상시험에 참여한 786명(평균연령 66세)을 대상으로 한 혈액 검사에서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킬 수 있는 뇌의 독성 축적과 관련된 단백질 가운데 하나인 타우(tau)를 감지하는 데 최대 97%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타우는 알츠하이머병 증상이 나타나기 10~15년 전부터 뇌에 쌓이기 시작할 수 있어 검사 정확도만 높다면 그만큼 발병 위험을 빨리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결과는 뇌척수액의 생체 지표를 이용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알츠하이머병 초기 단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현재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위해 뇌척수액을 뽑아내는 요추 천자나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 뇌 영상 검사를 한다. 몸에 검사 장비나 기구를 넣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검사법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의학협회(AMA) 학술지 ‘JAMA 신경학’(JAMA Neurology) 최신호에 올랐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5500만명이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다. 신규 환자는 매년 1000만명씩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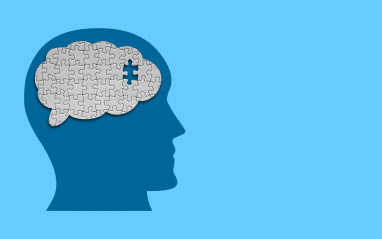

![리투아니아, 유럽 최대 바이오제조 인프라 구축 개시[제약·바이오 해외토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200195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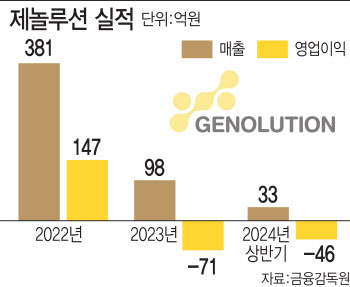
![랩지노믹스, 미국 진단시장 공략 가속화[인베스트 바이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300061b.jpg)
![경쟁사 개발 중단에 큐라클 미소…넥스턴·네이처셀 '계속 가네'[바이오맥짚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752b.jpg)
![[한주의 제약바이오]셀트리온 ‘짐펜트라’, 3대 보험 시장 모두 등재](https://image.edaily.co.kr/images/pharmedaily/noimg_a.jpg)

![HLB 품에 안긴 제노포커스 '쩜상'… 단독발표에 바이오솔루션도 상승[바이오맥짚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2900373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