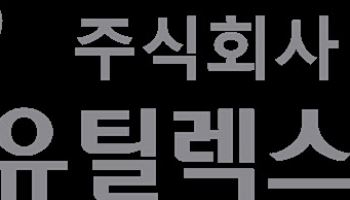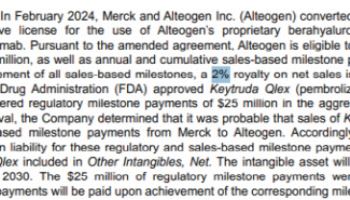[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환자의 충족되지 않은 의료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후보물질(기술)의 차별성이 있는지, 그 차별성을 임상 데이터를 통해 보여줬느냐가 중요하다.”
여재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전무(사무국장·사진)는 국내 제약 바이오기업의 기술수출 계약 성공 및 순항 비법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국내 신약 연구개발의 민간 컨트롤타워로 평가된다. 1986년에 글로벌 신약개발을 목표로 국내 신약 개발 제약 바이오회사가 주축으로 설립한 연구조합이다. 현재 대학교, 출연연구기관, 임상시험수탁기관(CRO)등 340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여재천 전무는 “글로벌 빅파마는 이전 기술이 물질적으로 혁신성이 있더라도 환자의 미충족 수요나 마케팅 및 보험 시장 장벽을 뚫을 수 없으면 사가지 않는다”며 “그런 시장성이 있는 기술이 후보물질 발굴 영역을 넘어서 임상에 들어가서도 임상적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 바이오기업의 기술수출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한단계 발전했다는 게 그의 평가다. 여 전무는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빅파마의 파트너사가 될 정도로 기술력을 가진 아이템을 기술수출하고 있다”며 “수출 금액도 종전과 다르게 1조원 금액대도 많이 나왔고 다양성 면에서 다국적 회사와 시장이 원하는 기술수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인상 깊은 기술수출로 미국 제약사 얀센에 1조4000억원 규모로 이전된
유한양행(000100)의 폐암 치료제 후보물질 ‘레이저티닙’과 미국 머크에 2조원대 규모로 수출된 GC
녹십자랩셀(144510)의 ‘CAR-NK’ 세포 치료제 플랫폼 기술 수출을 꼽았다.
여 전무는 이데일리 전수조사에서 2015년 이후 10건의 기술수출 중 8건이 순항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경쟁 기술과 경쟁사가 나오고 제약 산업 규제가 달라지는 시장 변화 속에서 그 만큼 순항하고 있다면 생각보다 많은 기술수출이 생존해 있는 거 같다”며 “다만 2015년 이후라면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른 측면도 있다”고 봤다.
그는 “일부 바이오기업은 임상 전문성에 대한 판단 능력이 떨어져 다음 임상 단계로 끌고 갈 명분이 없는 물질의 임상을 끌고 가는 허점이 공존하고 있다”며 “기술수출의 내실을 좀더 다지기 위해서는 국내 바이오벤처에 대한 투자 규모가 커지고 내부 인력 수준도 더 보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 로열티'가 무너뜨린 신뢰…알테오젠發 바이오株 동반 하락[바이오맥짚기]](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1/PS26012201091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