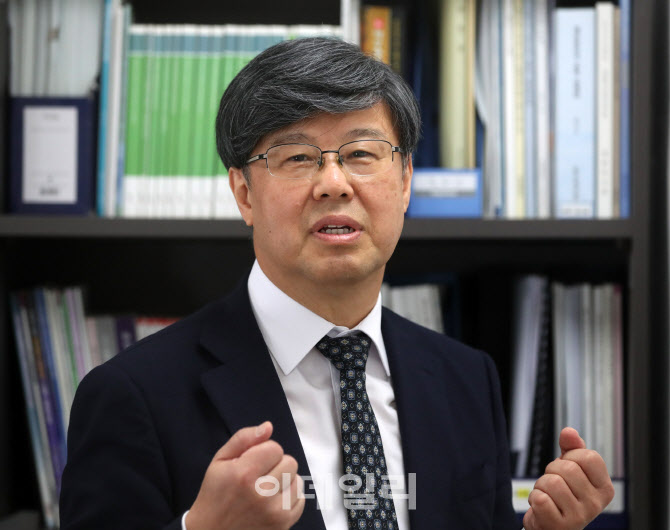 | |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동철 전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이번 미국발 행정명령으로 인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과 기업들의 타격은 미미할 것이다. 다만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수준에 도달하려면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전략에서 벗어나 신약을 개발해야 하고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해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등이 거대 시장에 직접 들어가 현지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국내 최고 제약산업정책 전문가로 꼽히는 서동철 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이번 미국발 바이오 분야 규제와 관련해 국내 기업들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향후 선진국발 규제에서 자유롭고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 핵심 기능을 선진국으로 이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전 교수는 중앙대 약대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와 미네소타대학교에서 각각 경영학석사와 보건경제학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럿거스 뉴저지주립대 약학대학에서 교수겸 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면서 미국 클린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보건의료 정책 설계팀에 참여한 바 있다. 또 국제제약경제정책연구소 소장을 지냈고, 2만명의 세계 약물경제 전문가가 회원인 세계약물경제학과성과연구학회 이사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8월 교직을 떠나 재단법인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서 전 교수는 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에 대한 배경에 대해 “미국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오리지널 의약품이다. 미국에서 의약품을 개발하고, 개발된 의약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게끔 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코로나 펜데믹을 거치면서 의약품 공급망이 문제가 되는 것을 경험했다. 이런 측면에서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통해 세계 의약품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는 생명공학 분야의 미국 내 연구와 제조를 강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바이오 생산을 확대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행정명령을 뒷받침할 20억 달러(약 2조 8000억원) 규모의 바이오산업 육성 투자 계획도 발표했다.
서 전 교수는 결론적으로 이번 미국발 바이오 규제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과 국내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미국이 자국 내 바이오 산업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도 잠재적인 경쟁자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결국 미국에 생산시설을 설립해 의약품을 생산하라는 것인데, 국내 기업들의 경우 미국에 수출하는 의약품이 많지 않다. 또한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문이 드는 만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약품 시장에서 원가경쟁력은 큰 무기이다. 대부분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통해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 자국 내 생산시설을 갖춘 곳은 많지 않은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대다수 기업이 인건비, 세금 등 원가경쟁력을 이유로 미국이 아닌 미국 근처의 중남미 국가에 생산시설을 짓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 전 교수는 “대부분의 미국 제약바이오 기업은 푸에르트리코 등에서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인건비 등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라며 “연구개발(R&D)의 경우 미국 내 수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몰려있지만, 생산시설은 많지 않다. 미국에서 생산할경우 생산비용이 올라가 약가도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미 정부에서 공장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도 미국 내 생산시설을 갖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동철 전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
|
그는 “약가가 올라가는 것은 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약가 인하 정책하고도 상반되는 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의약품을 수출할 때 이번 행정명령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의약품 개발 전략을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 전 교수는 “미국이 전 세계 의약품 시장 40%를 차지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의약품을 수출해야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의약품을 수출할 때 행정명령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희귀의약품을 개발해야 한다. 희귀의약품은 약가협상 예외 제품이고, 미국 밖에서 개발하고 생산해도 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거 개발한 신약은 세계 수억명한테 처방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항암제 등이 바이오마커를 통한 개인 맞춤형 의약품으로 개발되고 있다. 치료 효과는 높아졌지만, 대신 환자수가 확 줄어 등재되는 신약들이 대부분 희귀질환의약품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서 전 교수의 설명이다. 실제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한 48개 신약 중 21개가 희귀질환의약품이었고, 허가의약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서 전 교수는 국내 기업들이 미국 등 선진 시장으로 본사를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본사를 이전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핵심기능이 글로벌 시장으로 이전해 현지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미래가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유럽 제약기업들은 대부분의 본사가 미국 보스톤에 위치하고 있다. GSK, 사노피 등은 유럽 본사보다 미국 본사 규모가 훨씬 크다. 그만큼 세계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크다”며 “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셀트리온(068270) 등 국내 기업들도 본사 기능을 미국으로 이전해 현지에서 배우고 신약으로 경쟁해야 승산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경우 해외 지사를 만들지만 2~3년이 지나면 신경도 안쓰고 없어지기 일쑤다. 그러다가 10여년이 지난 후 다시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의약품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기업들이 미국에 지사를 만들어 20~30년씩 그대로 유지가 되고 지금은 엄청 커져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서 교수의 설명이다.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판단해 이익이 예상된다면 투자를 해야 한다. 삼성전자도 1972년 설립후 4~5년 동안 매년 적자가 1000억원씩 났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투자해 결국은 지금의 삼성전자가 있게 된 것”이라며 “제약바이오 산업도 장기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다. 특히 한국은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가 아닌 신약 개발에 정부와 기업이 장기적인 안목을 통해 전폭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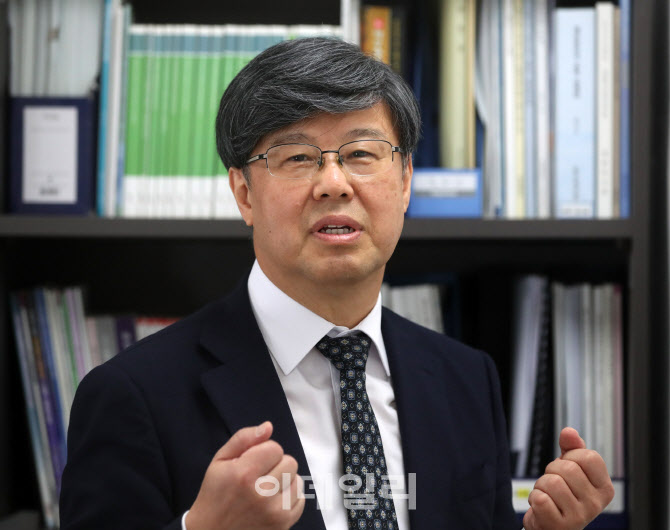


![김경민 용인세브란스 교수 "GLP-1 비만약, 복합제보다 투약 주기 관건"[전문가 인사이트]](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0301154b.jpg)



![에이프릴바이오, 임상 결과 전 내부자 매도…셀비온·뉴로핏은 강세[바이오 맥짚기]](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1100299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