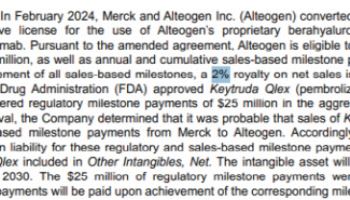[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큰 기대를 모았던
HLB(028300)그룹 간암 신약의 미국 품목 허가가 좌절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수정보완 요청이 담긴 보안요구서한(CRL)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신약허가 도전이 문턱을 못 넘는 잔혹사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FDA를 만족시킬 만큼 임상 규모가 크지 않고 FDA 허가 업무를 수행해 본 전문가 부족 현상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체적인 경험 부족이 원인인데 이런 부분을 하루빨리 보완하지 않을 경우 국산 글로벌 블록버스터 탄생은 요원하다는 분석이다.
 | | (왼쪽부터)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이장익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 김종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규제과학지원단장.(사진=이데일리 DB 및 서울대 약학대학,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
임상도 규모 경제 필요, 전문가 풀 정부가 구축해야 17일 HLB는 자사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맙 병용요법 간암 1차 치료제가 FDA로부터 보완요구서한(complete response letter, CRL)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양곤 HLB 회장에 따르면 FDA는 두가지를 지적했다. 항서제약 캄렐리주맙 제조·품질관리(CMC) 실사에 대한 문제와 임상 주요 사이트 실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이 지적됐다. 임상 사이트 실사 문제는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트 실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HLB 측은 FDA가 지적한 부분을 항서제약 측과 협력해 신속하게 보완한 후 품목허가를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장 높은 기대를 모았던 신약 허가는 물거품이 됐다.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이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 국산 신약의 미국 진출과 이를 통한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물로 성장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FDA 허가 도전은 대부분 실패에 그치고 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HLB외에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FDA 허가 실패 사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GC녹십자는 2015년 FDA에 면역글로불린 ‘IVIG-SN 5%’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두 차례 CRL를 수령한 뒤 허가를 받는데 실패했다.
메지온(140410)은 2020년 폰탄치료제 유데나필 글로벌 임상 3상을 마치고 FDA 품목허가 신청을 했지만 불발됐다. 메지온은 FDA의 요구에 따라 임상 3b상을 다시 진행 중이다.
한미약품(128940)도 2022년 기술수출했던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오락솔과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포지오티닙이 FDA 허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FDA 허가 도전이 번번이 실패로 귀결되는 것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과 산업의 한계가 여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먼저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전 중앙대학교 약학대 교수)은 규모의 경제가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서 소장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 미국 현지 등 글로벌 임상을 해야 하는데 FDA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환자 규모가 아닌 경우가 많다. 100~200명의 임상 환자 수준과 그보다 많은 숫자의 환자 군에서의 데이터 편차가 심하다”며 “같은 미국에서 임상을 하더라도 국내 기업 대부분은 임상수탁기관(CRO)에 대행을 맡기지만 글로벌 CRO와 그렇지 않은 CRO와 차이가 많이 난다. 결국 자금력을 바탕으로 고퀄리티 임상을 위해 필요한 지출을 해야 FDA가 만족할 만한 임상 디자인이나 결과가 나오는데 국내 바이오벤처 기업들의 자금 수준으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풍부한 자금이 없는 국내 바이오벤처 기업들의 현실에서는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초기 연구개발 단계가 아닌 끝단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글로벌 CRO와 협업할 수 있으면 좋지만 국내 기업들은 사실상 어렵다”며 “그렇다면 FDA가 만족하고 허가 단계에서도 충족시킬수 있는 임상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것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한계”라며 “작지만 경험이 많은 전문가나 CRO와 협업할 수 있는 풀을 정부가 만들어 줘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기업이 짊어져야 할 짐이지만 힘든 부분들을 정부가 도와주는 방식의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FDA 문화 잘 몰라...FDA 인허가 경험도 부족 규제당국 출신 전문가들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전반적인 경험 부족을 지적했다. FDA에서 10여년간 임상약리 심사관을 지낸바 있는 이장익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FDA 품목허가 실패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들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휴먼 인터랙션(interaction)이 약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즉 FDA 심사 심리 등 내부 문화에 대해 알고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보니 소통이 안되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니즈를 맞추지 못해 허가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종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규제과학지원단장은 FDA 허가를 받기 위해 무엇보다 FDA를 잘 파악해 임상 디자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FDA는 임상 전 프리 IND, 허가신청(NDA) 전에는 ‘프리 NDA’라고 하는 미팅 제도를 운영한다. FDA 허가를 목표로 하는 모든 기업이 하고 있다. 미팅 주제는 철저하게 회사가 궁금한 부분을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만 FDA가 답변하는 방식”이라며 “예를 들어 HLB의 허가가 불발된 원인에 대해 회사 측이 임상 3상 전이나 프리 NDA 미팅 당시 미진했거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FDA에 문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김 단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평가, 생물의약품평가, 바이오심사조정과 등을 거치면서 바이오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 심사 업무를 담당했다. 김 단장은 올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규제과학지원단장으로 파견된 규제 전문가다. 김 단장은 FDA 허가 과정 업무를 경험해 본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규제기관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 허가 업무를 해본 사람이 허가를 받는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허가받는 과정을 경험해봐야 1번부터 10번까지 고려해 허가 준비를 하고 그런 경험이 쌓이는 것”이라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 그런 부분에서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는 손에 꼽을 정도다.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임상 성공과 품목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해외에서 FDA 허가 업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영입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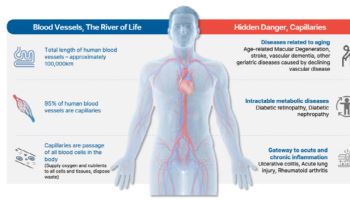
![알테오젠, 일시적 투심하락 관망세 전환…삼양바이오팜 가파른 상승[바이오맥짚기]](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1/PS26012300239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