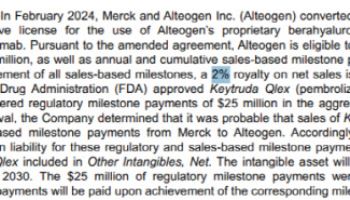팜이데일리 프리미엄 기사를 무단 전재·유포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이에 대해 팜이데일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합니다.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특허 경쟁이 격화되면서 특허 이슈가 기업 운명을 뒤흔드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플랫폼 기술 특허 이슈로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된 인투셀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특허 방어 수단인 특허 등록도 안 된 상태에서 기술거래가 이뤄진 것 자체가 리스크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리스크가 있는 거래인 만큼 특허 침해 가능성을 조사하는 ‘실시 자유’(FTO)를 꼼꼼하게 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과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분석이다.
최근 인투셀(287840)은 에이비엘바이오와 체결했던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됐다. 기술이전 계약은 2024년 10월 23일에 체결됐는데, 1년이 채 되기도 전인 지난 9일 전격 해지됐다. 에이비엘바이오가 계약을 스스로 해지키로 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기술 도입한 인투셀 넥사테칸 기술에서 발생한 특허 이슈로 인해, 해당 기술을 사용할 경우 특허 미확보 또는 제3자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더 이상 넥사테칸을 활용한 ADC 연구개발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 기업이 넥사테칸 기술과 유사한 특허 기술을 선출원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인투셀은 넥사테칸 특허를 2023년 12월 27일 가출원 했고, 2024년 12월 27월 국제출원했다. 반면 논란이 된 중국 기업의 특허 기술은 이보다 빠른 시기에 선출원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투셀 관계자는 “중국 기업의 특허는 우리보다 10개월 정도 선행했다. 에이비엘바이오와 계약 시점 FTO 분석에서는 관련 특허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허 전략의 일환으로 특허 기술을 가출원하는 경우도 많다. 가출원시 특허 기술 노출이 안 되고, 18개월 후 특허 출원 내용이 공개된다. 인투셀은 6개월마다 FTO를 했고, 에이비엘바이오도 꼼꼼하게 FTO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허 등 전반적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 (그래픽=이미나 기자) |
|
등록 안 된 특허, 방어 수단 없는데 기술거래 왜 했나 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거래 기술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했다. 인투셀은 넥사테칸을 활용해 복수의 기업과 플랫폼 기술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2023년 12월 4일, 에이비엘바이오(298380)와 2024년 10월 23일 체결했다. 모두 넥사테칸 기술이 포함된 거래였다.
하지만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계약 체결 당시에는 넥사테칸 특허가 출원조차 되지 않았다. 에이비엘바이오와 계약 체결 당시에는 넥사테칸 특허가 가출원 상태였다. 특허 출원이라는 것은 특허 등록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조치다. 신약으로 치면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신청을 한 것이지 특허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어권이 생긴 것이 아니다. 다만 특허를 선출원하면 우선권이 생긴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에이비엘바이오는 계약 당시 특허 리스크를 감수하고 계약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투셀 측은 특허 등록 전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ADC 업계에서는 특허 등록 전 다양한 기술 거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라고 말했다.
기술이전 계약에 정통한 바이오 전문 벤처캐피털 심사역도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특허 등록 전 기술이전 계약이 많이 발생한다”며 “특허 출원 후 등록 이전에 기술 거래를 하면 기술을 사가는 입장에서 기술료가 저렴하다. 이는 일반적으로 개발 초기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 출원 후 등록까지는 최소 18개월 이상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ADC 외 다양한 신약 분야에서 등록 전 기술이전을 하는 추세다. 대학교에서 특허 이전 받아올 때도 대부분 등록 이전 상태”라며 “특허 등록 이전에도 기술이전 케이스 매우 많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비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허 전문가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특허법인 제약바이오 전문 변리사는 “ADC 업계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특허 등록 전에 기술이전을 많이 한다.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술이전 거래를 하는 것”이라며 “특허등록까지 평균 3~5년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힘들다. 기술개발하면서 나오는 기술에 대해 공동 특허로 가져가는 등의 계약서 문항을 추가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먼저 물질이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차원이지만 리스크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그 동안 사례를 종합해보면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특허는 아주 큰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특허 검토는 반드시 고려하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많았다”며 “그러다 보니 인투셀 케이스가 발생한 것이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국내 기업들보다 훨씬 깐깐하게 특허 문제를 들여다보고 FTO 보고서를 기본적으로 요구한다. 인투셀과 에이비엘바이오도 FTO 분석을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중국 쪽 특허 기술을 놓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투셀·에이비엘바이오 모두 잘못...지식재산권 인식 및 실력 키워야 전문가들은 제품, 기술, 서비스 등이 다른 사람의 특허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조사 및 분석하는 FTO를 제대로 하려면 꽤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고 입을 모은다. 따라서 규모가 작고 자본이 부족한 바이오 벤처 기업이 제대로 하기엔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투셀은 기술특례방식으로 지난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는데, 당시 투자 설명서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가 있었음에도 지식재산권을 확보했다고 적시했다. 출원과 등록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인투셀의 기술은 가능성 있는 기술이지만, 사업개발 성과 부족과 에이비엘바이오와의 계약이 IPO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는 인투셀의 책임도 상당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에이비엘바이오 역시 좀 더 꼼꼼한 FTO 조사를 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기술을 사가는 쪽에서 FTO 분석을 한다. 이번 건은 결과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에이비엘바이오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변리사는 “기술특례상장을 한 인투셀은 생각보다 특허가 많이 없어서 놀랐다”며 “넥사테칸은 많이 알려진 화합물을 개량한 기술이라 유사한 화합물이 존재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화합물에 대한 FTO를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했어야 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