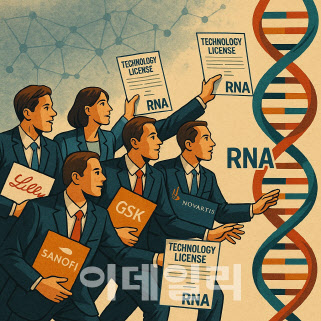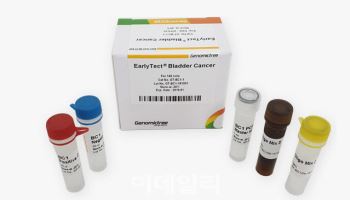팜이데일리 프리미엄 기사를 무단 전재·유포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이에 대해 팜이데일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합니다.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최근 리보핵산(RNA) 치료제가 글로벌 핫 트렌드로 뜨고 있는 추세다. 예전에는 한국이 RNA 분야에선 변방에 있었고 미국, 유럽 위주였는데 이제 한국까지 그 물결이 오고 있는 것 같다.”
한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RNA 붐이 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올 상반기 올릭스(226950)와 알지노믹스가 잇따라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빅딜을 체결한 것도 K바이오가 글로벌 RNA 신약 개발 무대에 본격 합류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앞서 올릭스는 지난 2월 릴리와 총 6억3000만달러(약 9117억원) 규모의 비만·대사이상 지방간염(MASH) 신약 ‘OLX75016’(OLX702A) 공동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짧은 간섭 리보핵산(siRNA) 기술력을 입증했다. 지난 5월에는 알지노믹스가 릴리에 RNA 편집치료제 개발 기술을 1조9000억원에 수출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국내 바이오벤처들이 빅파마의 선택을 받은 배경에는 해당 기업들의 차별화된 기술력뿐 아니라 혁신 RNA 기술을 선점하려는 글로벌 흐름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릴리뿐 아니라 빅파마들의 RNA 플랫폼 확보에 혈안이 돼있다”며 “이렇다 보니 올릭스, 알지노믹스에도 기회가 온 것 같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빅파마, RNA 기술 확보에 혈안 실제로 최근 3년간 릴리, 사노피, 노바티스, 노보 노디스크, GSK 등 웬만한 글로벌 제약사들은 RNA 기술 거래 이력이 있다. 다케다제약, 다이이찌산쿄, 오노약품, 닛폰신야쿠(Nippon Shinyaku) 등 일본 제약사들도 RNA 기술 도입에 나선 점이 눈에 띈다. 2025년 한 해로만 좁혀봐도 글로벌 제약사들은 RNA 기술 관련해 굵직한 딜을 다수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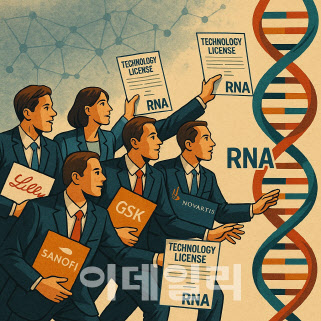 | | 글로벌 빅파마들이 RNA 신약 개발 기술 확보에 활발히 나서는 모습에 대한 이미지 (사진=챗GPT) |
|
일라이 릴리는 올해 올릭스, 알지노믹스뿐 아니라 미국 크레욘 바이오(Creyon Bio)와 지난 4월 다중 타깃 올리고핵산 공동개발·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활발하게 RNA 기술 거래를 펼쳤다. 이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이후’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릴리와 비만약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노보 노디스크도 RNA 기술에 눈을 돌리고 있다. 노보 노디스크는 지난달 28일 미국 레플리케이트 바이오사이언스(Replicate Bioscience)와 5억5000만달러(약 7700억원) 규모의 자가복제 RNA(srRNA) 플랫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비만·당뇨 RNA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바티스는 이달 초에만 이틀 연속 siRNA 치료제 기술을 도입하는데 약 10조원을 베팅하며 뜨거운 관심을 표명했다. 노바티스는 지난 2일 미국 애로우헤드 파마슈티컬스(Arrowhead Pharmaceuticals)의 파킨슨병 치료제의 전 세계 독점 라이선스를 총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에 사들였으며, 지난 3일에는 중국 아르고 바이오파마(Argo Biopharma)의 심혈관질환 치료 후보물질들의 중국 외 지역 권리를 총 52억달러(약 7조2400억원)에 도입했다.
항체-약물접합체(ADC)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일본 다이이찌산쿄도 RNA 기술 확보에 힘쓰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노시스 바이오사이언스(Nosis Bioscience)와 만성질환 대상으로 심장, 뇌, 폐 등 주요 장기 세포를 타깃하는 RNA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옵션 딜을 체결했다. 지난 4월에는 미국 웨이파인더 바이오사이언스(Wayfinder Biosciences)와 RNA 타깃 소분자를 활용한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전략적 협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처럼 글로벌 제약사들이 앞다퉈 RNA 기술 확보에 나서는 이유는 RNA 치료제의 상업적 가치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RNA 치료제가 증가하면서 연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의약품도 늘고 있다. RNA 치료제의 적응증이 희귀질환에서 심혈관질환, 대사성 질환, 중추신경계(CNS)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도 매력 포인트다.
K바이오, 글로벌 RNA 신약 생태계 핵심 축으로 부상 RNA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모달리티로 올라서면서 국내에선 올릭스, 알지노믹스가 글로벌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미 릴리와 빅딜을 통해 RNA 기술 거래 레퍼런스를 확보, 글로벌 RNA 신약 기술 공급자로 부상하게 됐다.
올릭스는 siRNA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추가적인 글로벌 기술이전을 겨냥한다. 차세대 플랫폼 개발을 위해 지난달 말 전환우선주(CPS) 발행을 통해 1150억원의 자금도 확보한 상태다.
올릭스는 차세대 플랫폼을 통해 비만, 근육, CNS 등 더 핫한 적응증으로 영역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간 외 조직에도 적용 가능한 자가전달 비대칭 siRNA(cp-asiRNA)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지방세포나 근육세포를 타깃할 예정이다. siRNA 기술에 혈뇌장벽(BBB) 셔틀 기술을 결합해 근육 조직이나 CNS를 표적하는 siRNA 치료제 개발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BBB 셔틀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알지노믹스는 RNA 편집치료제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독자적인 ‘트랜스 스플라이싱 리보자임’(TSR)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은 돌연변이 유전자의 특정 부분을 정밀하게 교정할 수 있어 기존 안티센스 올리고핵산(ASO)이나 siRNA 대비 근본적인 치료 접근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앞다퉈 RNA 편집 플랫폼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 파트너십이나 공동개발을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
알지노믹스가 해당 플랫폼 기술을 통해 발굴한 다양한 파이프라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알지노믹스가 원발성 간암·교모세포종 치료제로 개발 중인 ‘RZ-001’과 망막색소변성증 치료제 ‘RZ-004’는 임상 1/2a상 중이다. 이 중 핵심 파이프라인인 RZ-001은 간암 1차 치료제를 노리고 있다.
글로벌 RNA 신약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에스티팜(237690)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스티팜은 글로벌 톱3 올리고핵산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로 다수의 빅파마에 올리고 API를 공급하고 있다. RNA 치료제는 생산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글로벌 RNA 선두 기업인 앨나일람, 아이오니스도 상업화 생산은 주로 CDMO에 위탁한다.
현재 에스티팜은 고객사로 노바티스, 앨나일람, 바이오젠, 제론(Geron), 아이오니스 등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며,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비해 생산능력(Capa)을 2배 이상 늘리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내년이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올리고 Capa를 갖출 전망이다.
에스티팜은 글로벌 트렌드를 신속하게 포착해 싱글 가이드 RNA(sgRNA) 원료 CDMO 사업에도 진출했다. sgRNA는 RNA 유전자 편집 치료제에 필수적인 원료이다. sgRNA 원료는 올리고보다 고순도를 유지해야 하고 합성이 어려워 단가와 진입장벽이 높다. 에스티팜은 올해 3분기에 sgRNA 전용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생산라인을 완공할 예정이다.
이지수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올릭스는 빅파마 계약 대비 저평가 구간에 있으며, 에스티팜은 RNA 치료제 상업화 및 대규모 환자군 적응증 확장에 따른 생산 수요 증가의 직접적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