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류성 바이오플랫폼 센터장]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스마트폰 등은 한국경제를 견인하는 중추적인 성장동력으로 꼽힌다. 그런데 이들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독자 개발한 국내 업체들이 미국, 중국, 유럽 등 경쟁업체들에게 수익창출을 위해 너나없이 라이선스 아웃(기술수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내 제조사들은 해외 경쟁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며 중차대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은 불문가지다.
바이오산업에서는 실제 그런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나아가 대부분 K바이오텍은 주요 사업모델로 신약의 기술수출을 첫손에 꼽는다. 업계도, 투자자도 바이오업체의 기술수출 성과를 최고의 사업 경쟁력으로 평가하며 치켜 세운다. 요컨대 회사 이력에 최소한 한두건의 신약 기술수출 성적표가 들어가 있어야 미래가 유망한 바이오텍으로 대접받는 분위기가 강하다.
물론 바이오 업계에서 기술수출이 대세가 된 것은 신약개발만이 갖고있는 독특하고도 어려운 과정 탓이다. 신약후보물질 발굴 단계에서부터 신약 상용화까지 성공확률은 0.01%에 불과하다. 게다가 상용화하려면 평균 10여년간 조단위 연구개발비용을 감수해야한다. 자본력이 약한 국내 바이오벤처들로서는 신약 상용화를 독자적으로 완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그 중간 단계에서 개발중인 기술을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라이언스 아웃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고 K바이오가 바이오 신약 기술수출을 지상과제로 삼고 앉아 있을수는 없다. 특히 제약강국 도약을 노리는 K바이오로서 독자적 신약 상업화는 더이상 미룰수 없는 당위성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기술수출은 엄밀히 보면 ‘기술유출’과 크게 다르지 않다. K바이오텍들이 개발중인 핵심 신약기술을 다국적 제약사들에게 라이선스 아웃하는 것은 결국 K바이오 자체 신약 상업화 가능성을 스스로 꺾는 셈이다. 실제 화이자, 머크, 노바티스, 로슈 등 글로벌 제약사들은 한국을 포함 글로벌하게 성공 확률이 지극히 높은 신약물질들만 사들여 글로벌 블록버스터를 만들어 내는 선순환 구조에 들어선지 오래다. 그야말로 이들에게는 바이오사업은 ‘땅집고 헤엄치기’ 비즈니스 모델이다.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임상3상을 거쳐 상업화까지 이뤄내기 위해서는 막대하게 소요되는 자금이 최대 걸림돌이다. 현재 국내 바이오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신약후보물질, 전임상, 임상1상 단계인 바이오텍들을 대상으로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 정부의 바이오 연구개발(R&D) 지원 또한 마찬가지다. 전체 신약개발 비용의 90%가 임상2상과 임상3상 단계에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바이오 투자 및 정부 지원 구조로는 K바이오기업들이 자력으로 상용화까지 나서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결국 정부가 나서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 내부에서 나온다. 지난해 과기정통부, 복지부, 산업부등 3개 부처는 바이오 연구개발에 모두 1조2000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등을 제외하고 신약 임상2상, 3상을 위한 예산지원은 사실상 전무했다. 업계는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임상2상, 3상 지원에 바이오 연구개발 지원비를 집중해 줄것을 바라고 있다. 제약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신약 개발의 초기단계는 민간투자가, 중간 단계인 임상2상~3상은 정부가 각각 맡는 투트랙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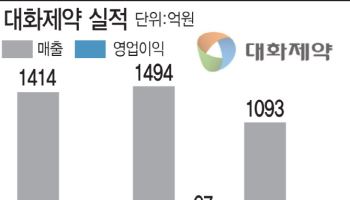
![이혁준 서울대병원 교수 "암환자 식단관리앱 힐리어리 예후 바꿀 첫 도구 "[전문가 인사이트]](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12/PS25121100299b.jpg)
!['상장 첫날 시총 2.8조' 에임드바이오, 코스닥 다크호스 급부상 [바이오맥짚기]](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12/PS25120500172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