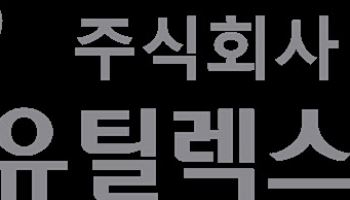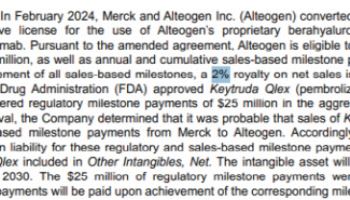[이데일리 류성 제약·바이오 전문기자]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돼 있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품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의약품은 다른 일반 제품과 달리 국가가 직접 개입, 판매 가격을 거의 전적으로 결정하는 독특한 구조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정부로서는 틈나는대로 의약품 가격을 낮추려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에 약값이 낮아질수록 국민들도 대환영하는 상황이니 정부의 약가 인하정책은 갈수록 강경해지는 추세다.
문제는 정부의 의약품 가격인하 정책이 과도했을때 발생하는 폐해다. 정부가 책정한 의약품 가격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정작 의약품을 연구개발한 제약사들은 적정 이윤을 남길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적절한 이익을 남겨야만 신약에 대한 연구개발에 매진할수 있는 기업으로서는 진퇴양난에 몰릴수 밖에 없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약 가격이다. 10여년에 걸쳐 수백원에서 수천억원을 들여 개발한 국산 신약이 정부의 저가정책으로 적정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현행 약가 결정 프로세스는 신약의 가격을 심지어 복제약보다도 낮게 책정하는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한탄한다.
실제 정부는 복제약을 포함해 신약을 대체할수 있는 약제들의 시장가격을 가중평균한 가격의 90~100% 수준으로 신약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요컨대 신약 가격을 원천적으로 복제약보다 높게 정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오랜 세월 어렵사리 일궈낸 신약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의욕을 기대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아직도 신약 대신 복제약으로 연명하는 제약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내 제약업계의 현실이 그 결과물이다. 실제 25조원 규모인 국내 의약품 시장을 두고 복제약으로만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제약사들만 300여곳에 달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국내 신약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및 대만을 포함한 국가들의 4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이들 국가의 제약사들보다 절반 이하의 ‘헐값’에 판매를 하고 있는 셈이다.
현 문재인 정부는 한국을 ‘제약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출범 초기부터 기회 있을때마다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제약강국의 반열에 오르느냐의 여부는 결국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판가름한다. 그럼에도 제약사들이 천신만고 끝에 개발한 신약에 대한 ‘푸대접’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실은 정부의 진정성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심지어 한 메이저 제약사는 얼마전 신약을 개발하고도 낮은 약가로 채산성이 맞지 않아 허가를 자진 취하하기도 했다.
국가의 의료재정 부담을 감안하면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은 충분한 타당성과 명분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적인 측면을 간과한 일방적이고 과도한 약가정책은 결국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다름 아니다. 복제약에 대한 더욱 과감한 가격인하로 확보한 재원을 활용, 신약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수 있도록 하는 약가정책의 혁신적인 변화가 시급하다.







!['2% 로열티'가 무너뜨린 신뢰…알테오젠發 바이오株 동반 하락[바이오맥짚기]](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1/PS26012201091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