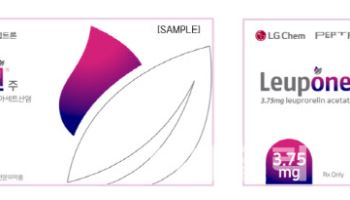[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리가켐바이오(141080)가 올해 마일스톤(기술료) 등을 통해서 26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3개의 파이프라인에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안정적인 매출 확보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리가켐바이오가 기술수출한 파이프라인 ‘LCB84’의 글로벌 임상 1상이 순항하면서 올해 안으로 데이터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LCB84는 리가켐바이오가 지난 2023년 12월 존슨앤드존슨 자회사 얀센에 2조2000억원 규모로 기술수출한 물질이다.
 | | 김용주 리가켐바이오 대표. (사진=리가켐바이오) |
|
김용주 리가켐바이오 대표는 “LCB84는 현재 글로벌 임상 1상 진행 중으로 임상 성과에 따라 권리를 가진 얀센이 옵션을 행사 할 수 있다”며 “이때 2억달러 규모 옵션 행사에 따른 수익 발생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LCB84를 기술도입한 얀센은 임상 1상 데이터를 근거로 ‘단독 개발’을 고민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리가켐바이오가 얀센과 체결한 기술수출 계약에 따르면 단독 개발 옵션 행사금액 규모는 2607억6000만원에 달한다.
LCB84는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TROP2 항원을 타깃한다. TROP2를 타깃으로 하는 약물 중 다이이찌산쿄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개발한 다토포타맙 데룩스테칸(Dato-DXd)이 지난해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혁신 치료제 지정 받았다.
리가켐바이오 LCB84는 후발주자이지만, 계열 내 최고(Best In Class)가 될 것으로 주목 받는다. 경쟁 약물과 달리 TROP2 중에서도 잘린 형태의 TROP2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효과와 안전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공개된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약물이 의도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효과 용량’(efficacious dose)의 최소값이 리가켐바이오 LCB84는 2㎎/㎏다. 이는 경쟁 약물인 길리어드 트로델비 100㎎/㎏ 대비 50분의1 수준이며 같은 계열의 다토포타맙 데룩스테칸 10㎎/㎏ 대비해서도 낮다.
이어 지난해 10월 오노약품공업에 기술수출된 ‘LCB97(L1CAM-ADC) 패키지딜’ 마일스톤 수익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술수출 계약은 리가켐바이오가 시도한 첫 ‘패키지딜’로 ADC 파이프라인인 LCB97와 ADC 후보물질을 발굴·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이전했다.
리가켐이 오노약품에 LCB97를 기술이전하면서 받은 선급금은 비공개지만 총 계약금액은 9400억원에 달한다. 특히, 폐암·췌장암·대장암 등 다수의 고형암에서 발현되는 단백질 ‘L1CAM’을 타깃으로 하는 ADC가 동시에 개발된다면 총 계약금액이 증가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안정적 실적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 대표는 “LCB97의 경우 지난해 기술수출 체결 당시 공시를 통해 언급한 단기 마일스톤 수령이 12월에 있었고 이를 시작으로 올해에도 연중 잔여 단기 마일스톤들에 대한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에 2017년 5월 기술수출한 오토텍신 저해제 ‘BBT-877’을 통한 수익도 기대된다. 특발성폐섬유증(IPF) 치료제로 개발 중인 BBT-877은 현재 글로벌 임상 2상 진행 중으로 올해 2분기 중 임상이 종료될 예정이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올해 4월까지 톱라인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며, 다국적 제약사들과 지속적으로 기술수출을 논의 중에 있다.
리가켐바이오는 브릿지바이오와 계약 체결 당시 마일스톤 뿐 아니라 이익 배분에 대한 내용도 계약서에 담았다. 선급금 및 단계별 마일스톤과 별도로 제3자 대상 기술수출시 양사는 합의된 비율에 따라 이윤을 얻는다.
김 대표는 “브릿지바이오에 따르면 연내 BBT-877 기술수출 또는 임상 3상 진입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규모 기술이전 계약 체결 시 유의미한 수준의 수익 배분(Profit Sharing)이 예상되며 임상 3상 진행 시에는 마일스톤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는 신약 후보물질을 임상 단계까지 개발한 후 가치를 높인 뒤 기술수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만 파이프라인이 지속 늘어나고 내부 인력만으로 모든 프로젝트를 임상단계로 진입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 판단에 따라 후보물질 단계에서 기술수출도 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료제 상업화 모멘텀에 바이젠셀·펩트론 주가 '들썩'[바이오멕짚기]](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7/PS25071600193b.jpg)


![[르포] 안드로이드 탄생한 보스턴CIC가보니…"K-바이오, 빅딜 마중물"](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7/PS25071401146b.jpg)
![이승호 데일리파트너스 대표 “하반기 바이오 전망 밝다, 다중항체 주목”[바이오 VC 집중조명]①](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7/PS25071500005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