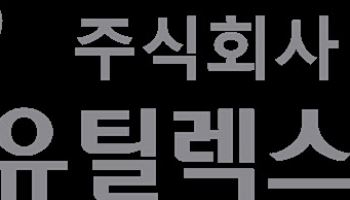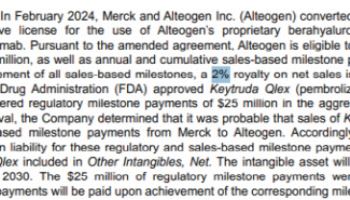김태억 리드컴파스 인베스트먼트(VC) 대표가 국내외 주요 신약개발 동향을 한달에 한번 전한다. 주목해야 하는 신약개발 기술과 회사, 효과 등을 톺아본다. 특히 제약 바이오 투자자의 관점에서 그런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짚는다. 김 대표는 기술경제학 박사(영국 리즈대학)로 ‘신약 후보물질 감별사’로 통한다. 2015년부터 지난 4월까지 K바이오의 해외 기술수출을 지원하는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본부장)에 몸담았다. 그 기간 700여개로 추정되는 국내 신약 후보물질 가운데 정부 지원을 받은 600개의 가치를 모두 평가했다. 국내 신약 후보물질의 현황과 수준, 해외 신약개발 동향 등을 꿰뚫고 있다는 평이다.
[김태억 리드컴파스 인베스트먼트(VC) 대표]1980년대 창업한 바이오벤처로 빅파마 대열에 진입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암젠과 길리어드이다. 암젠이 먼저 빅파마에 진입했지만 성장세나 수익률 측면에서는 길리어드가 더 높다. 길리어드는 회사 설립후 13년 만인 2001년에 첫 순이익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다시 12년 만인 2013년 매출액 기준 빅파마 10위권으로 성장했다. 길리어드사는 2020년 현재 영업이익 53%, 순수익률 42%로 투자수익률이 가장 높은 제약기업 중 하나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치사율 100%의 AIDS를 치료할 수 있는 비리어드(Viread)를 개발한 회사이자 C형 간염을 97% 완치시킬 수 있는 소발디(Sovaldi) 개발사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험을 기준으로 본다면 바이오벤처로 창업해서 빅파마가 될 수 있는 확률은 0.15%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과연 길리어드사는 무엇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빅파마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미리 결론을 요약해서 말한다면 첫째 과감한 전략전환, 둘째가 공격적 인수합병, 그리고 가끔씩 등장했던 행운이 성공의 3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핵산 치료제에 대한 길리어드의 야심 길리어드사는 1987년에 올리고겐(Oligogen)이라는 이름으로 창업했다. 당시 창업자인 마이클 리오단(Michael L. Riordan)은 나스닥 시장이 폭락하기 하루 전에 멜론 벤처(Menlo Venture)사로부터 2백만 달러를 투자받아서 창업한 뒤 5년 만인 1992년에 나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하루만 늦었더라면 아예 창업이 어려울 수도 있었던 것이다. 리오단은 창업과 동시에 그 당시 이미 노벨상을 수상한 해럴드 바머스(Harold Varmus)와 10년 후 노벨상을 수상하게 될 잭 조스택(Jack Szostak)을 과학자문단으로 초빙하는가 하면 향후 미국 국무부장관이 될 도널드 럼스펠드를 회사의 고문으로 위촉하는 한편,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버핏을 이사회 멤버로 초빙하려고 했다(워렌버핏은 이사회 참여도 거절하고 투자제안 역시 거절했다).
리오단은 당시 미국 바이오벤처 업계에서 가장 최신의 기술이자, 가장 잠재력이 컸던 안티센스(Antisense) 기술에 승부를 걸었다. 안티센스는 리보핵산(RNA)에 대해 상보적으로 결합해서 질환유발 유전자의 발현을 가장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항체에 비해서도 선택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길리어드보다 8년 전에 창업한 안티바이럴(Antivirals Inc)(2012년 사렙타(Sarepta)로 사명 변경)이 안티센스 기반의 신약개발 영역을 선점했지만 안티센스 합성이 매우 어렵고, 유전자 분석 시퀀싱 기술이 성숙하지 않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개발속도가 매우 느렸다. 이러한 빈틈을 노려 리오단은 기술적 장벽 돌파를 위한 최고의 과학자, 회사의 빠른 성장에 필요한 고위급 인사들을 확보하려 했다. Oligogen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성서에 기록된 만병통치약 Gilead로 회사명을 변경한 것 역시 리오단이 안티센스 기술에 대해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과감한 전략전환 리오단은 당시의 미국 바이오벤처 생태계가 재조합 단백질과 항체를 중심으로 대세가 형성되고 있는 와중에 안티센스 기술의 더 높은 성장잠재력에 대한 확신으로 과감하고 신속한 개발전략에 승부를 걸었다. 창업 후 3년 만인 1990년 GSK로부터 안티센스 기반 신약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 나스닥 상장을 통해 조달했던 980억원과 비슷한 규모인 860억원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하지만 8년 간의 공동연구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티센스 기반 신약개발의 가장 어려운 기술적 난제인 생체내 세포전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 결과 1998년 GSK와의 공동개발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그동안 확보했던 안티센스 관련 특허들을 92억원에 모두 이시스(ISIS)(현재의 IONIS)사로 넘겨주고 안티센스 신약개발 무대로부터 철수하게 된다. 그 대신 길리어드는 안티센스 기술의 첫 번째 대상질환이었던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분야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게 된다. 이를 위해 리오단은 1990년에 BMS의 항바이러스 연구자였던 존 마틴(Jhon Martin)을 영입하게 된다. 존 마틴은 BMS가 체코로부터 도입했으나 개발을 포기한 물질인 시도포비어(Cidofovir)로 AIDS에 의한 CMV 망막질환 치료제 임상을 진행, 1996년 시판승인을 획득했다.
이에 반해 ISIS사가 개발한 동일질환 치료제 포미비르센(Fomivirsen)은 1998년에 시판승인을 획득했으나 이때에는 이미 효과적인 에이즈 치료제가 일반화되면서 에이즈 망막질환 환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던 시기였다. 게다가 안티센스 기반 신약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생체내 타겟세포 전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Fomivirsen은 안구 내에 직접 주사해야만 한다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출시시점의 차이와 약물 전달방식의 차이가 상업적 성공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된 것이다.
안티센스 기술이 가지고 있는 온갖 장점에도 불구하고 생체내 세포전달 문제를 단기간내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길리어드의 판단은 올바른 것이었다. 창업의 기반이 되었던 기술이자 길리어드와 GSK가 10년 이상 전력을 다해 선점하려던 분야에서 철수한다는 것은 재창업에 비견될 만큼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감한 결단이 길리어드를 빅파마로 초고속 성장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길리어드로부터 안티센스 기술을 넘겨받은 ISIS를 비롯, 안티센스 기반의 대표적 경쟁사인 사렙타(Sarepta), 애닐럼(Alnylum), 하이브리디온(Hybridon))등은 생체내 세포전달 문제를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결하지 못했다(간을 비롯한 특정장기로만 생체내 세포전달 가능한 수준)
공격적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진출 길리어드는 시도포비어(Cidofovir)의 성공을 계기로 1999년 유럽의 HIV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넥스타 파마(Nextar Pharma), 다우노솜(DaunoXome)을 인수합병했다. 이를 통해 시장 영업망을 확보하게 된 길리어드는 2001년 베스트 인 클래스(Best in Class) 치료제 Viread를 출시하면서 매출액 5000억원을 달성하게 된다. 또한 1999년에 시판승인을 획득한 항바이러스 독감치료제 타미플루의 경우 로슈(Roche)사에 마케팅 판권을 넘겼는데, 2004년부터 조류독감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연간 2000억원의 매출을 안겨주었다.
길리어드는 2000년대 이후 간 질환과 호흡기 질환에 집중하기 위해 개발중인 항암 파이프라인 전부를 미국 제약기업 OSI에 2000억원 규모로 매각하고, 4000억원을 투자해서 간질환 치료제 마켓팅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던 트라이앵글(Triangle)사를 인수했다. 인수합병은 이후로도 계속되어 2006년 심장질환 치료제 개발기업인 미오겐(Myogen)을 2조 5000억원에, 호흡기 질환 치료제 개발기업인 코러스 파마(Corus Pharma)를 4200억원에, 2007년에는 레스퍼로토리(Respiratory Therapeutics)와 CV Therapeutics를 총 1400억원에 인수해서 호흡기 질환과 심장질환 마케팅 파이프라인을 완성했다. 그중에서도 C형 간염(HCV) 치료제 소포스부비르(Sofosbuvir)를 보유한 파마셋(Pharmasset)사를 1조원 규모에 인수한 것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다. 파마셋 인수 2년 만인 2013년에 소발디(Sovaldi) 시판승인을 획득한 길리어드는 소발디 매출에 힘입어 2014년 연매출 37조원을 기록하면서 빅파마 10위권에 진입했다.
이에 반해 2015년 이후 개발중인 파이프라인을 라이센스-인 혹은 인수합병했던 물질들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대표적인 사례로 간경화(NASH) 치료제, 항암 치료제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인수했던 ‘페넥스 파마슈티컬스(Phenex Pharmaceutical), 님버스 아폴로(Nimbus Apollo), 에피테라퓨틱스(Epitherapeutics)등에서 개발한 물질들은 모두 시판승인을 획득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C형 간염에 대해 94~97%의 완치율을 보여준 소발디의 탁월한 치료효과로 인해 시장 자체가 축소되면서 2016년 이후 길리어드의 매출액 역시 하락 반전을 시작하게 된다.
길리어드의 행운은 지속될까? 2017년 이후 길리어드는 매출액 상승 반전을 위해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카티(CAR-T) 치료제 개발기업인 카이트(KITE)사를 13조원에 인수하는가 하면, 2020년에는 면역항암 항체신약 개발기업 포티 세븐(Forty Seven)을 5조 6000억원에 인수했고, ADC 개발기업인 이뉴모메딕스(Immunomedics)를 24조원에 인수하는 등 3개 기업 인수합병에 40조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카이트사의 CAR-T 치료제 매출액은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포티세븐의 경우 경쟁 파이프라인 대비 미래 상업적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이뮤노메딕스의 ADC 기반 유방암 치료제가 투자액 이상의 매출(분석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연매출 8억 달러 수준)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하다.
에이즈 치료제, C형 간염 치료제 시장에서 공격적 인수합병으로 고속성장을 거듭했던 길리어드가 항암제 분야에서도 인수합병 전략을 통해 또다시 성공할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2017년 이후 항암제 분야에서 길리어드가 진행했던 대부분의 인수합병에 대해 “조급해진 길리어드가 과도한 프리미엄을 지불한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길리어드가 그동안 축적해온 항바이러스 개발 기술경쟁력과 무관한 영역에서 인수합병이 진행된다는 점도 주요 우려사항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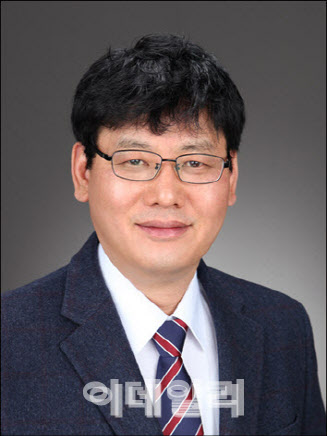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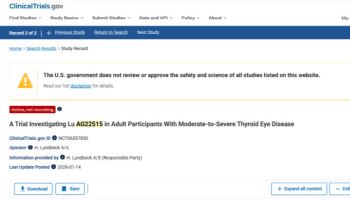



!['2% 로열티'가 무너뜨린 신뢰…알테오젠發 바이오株 동반 하락[바이오맥짚기]](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1/PS26012201091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