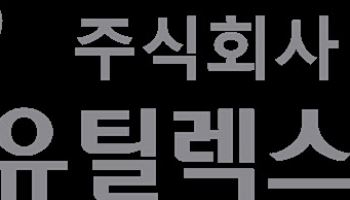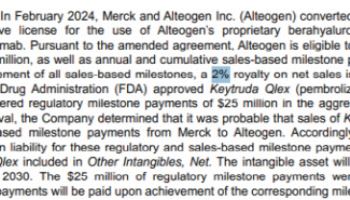[이데일리 류성 제약·바이오 전문기자] “지금처럼 초기 신약후보물질을 대상으로 정부자금을 나눠주기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이제는 상업화까지 이룰 가능성이 높은 임상 2~3상 단계에 있는 신약만을 엄선해 집중 지원해야 할 시점이다.”
국가의 제약·바이오 연구개발 지원정책에 있어 지금부터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펴야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얼마되지 않은 연구개발 지원금을 수많은 제약사들에게 쪼개주다보니, 결과적으로 한국은 여전히 글로벌 블록버스터 하나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 지원예산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임상3상은 정작 배제하는 실정이어서 신약 상용화를 노리는 기업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다.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되기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글로벌 임상3상은 평균 수천억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된다. 자금력이 부족한 국내 기업들이 임상3상은 꿈도 못꾸고 신약 개발을 중도에서 포기하면서 기술수출에 목메는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 정부가 제약·바이오 업계의 연구개발(R&D) 지원금으로 책정한 예산은 2조8000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글로벌 제약사 로쉬가 지난 2020년 연구개발로 지출한 금액(14조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또다른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존슨의 연구개발비(12조원)와 비교해서는 4분의 1토막이다.
다른 여타 산업보다 개발부터 상용화까지의 제품 사이클(평균 10년)이 긴 제약·바이오 산업은 연구개발비 지출여력이 그 기업의 경쟁력을 판가름한다. 제약강국을 외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한국 제약·바이오 업계로서는 충분한 연구개발비 확보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현실을 돌아보면 여전히 ‘제약강국’의 꿈은 멀어 보인다. 무엇보다 규모의 경제를 이룬 국내 제약사들이 거의 없다보니 부족한 연구개발비 탓에 상용화까지 자체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2020년 기준)는 23조원에 불과하지만 국내 의약품 생산업체는 무려 1398개사에 달한다(식약처 자료). 한 업체당 고작 평균 160억원 안팎의 매출을 거두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신약하나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조단위의 천문학적 연구개발비는 언감생심이다. 이 결과가 초라한 국내 신약개발 성적표다. 지난 2018년까지 매년 1~2개씩 명맥이나마 이어가던 신약허가는 2019년, 2020년 연이어 전무한 상황이다.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처간 효과적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바이오헬스산업 연구개발 지원규모를 대폭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기대를 걸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즐비한 미국, 유럽등과 경쟁하면서 우리가 제약강국 리그에 진입하려면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제약·바이오 정책이 관건이다.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핵심이 돼야하는 이유다. 차기 정권이 임기내 조단위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일궈내는 정책을 성사시킨다면 제약강국으로의 도약 목표는 이미 현실이 되어있을 것이다.







!['2% 로열티'가 무너뜨린 신뢰…알테오젠發 바이오株 동반 하락[바이오맥짚기]](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1/PS26012201091b.jpg)